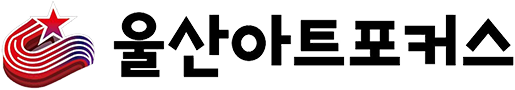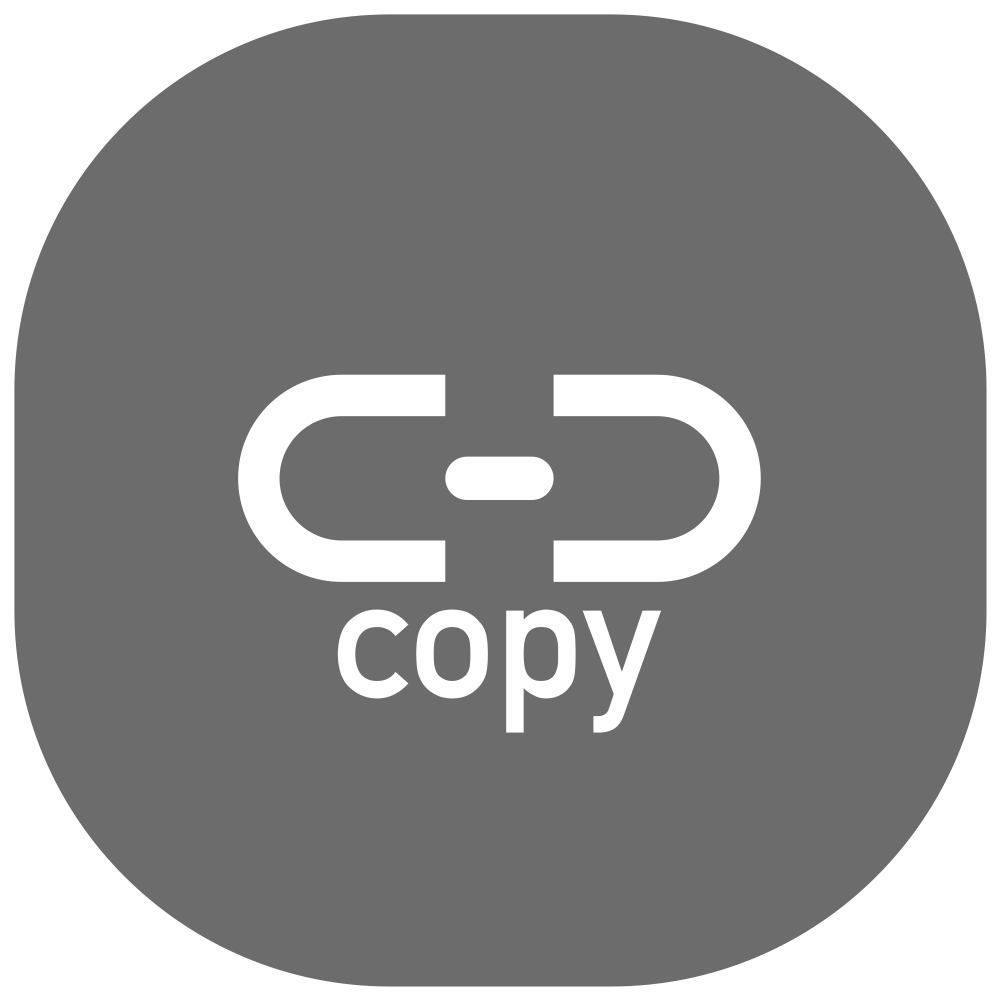칼럼 법의 이름으로, 누구를 위한 법인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편집부 작성일 25-04-07 15:09 |
본문
(울산아트포커스 박준섭) 법의 이름으로, 누구를 위한 법인가
춘추전국시대 법가 사상의 핵심은 분명하다.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예외는 없다.
이는 당시에도 혁명적인 발상이었다. 귀족, 지식인, 용맹한 자 – 이른바 특권층은 법의 그물 밖에 있었고, 유가는 이를 당연시했다.
예불하서인(禮不下庶人), 형불상대부(刑不上大夫)
예는 서민에게 미치지 않고, 형벌은 귀족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이 원칙은 당시 통치 질서의 핵심이었다. 법가는 이 구분을 통렬히 부정했다. 법 앞에 예외란 없다. 대부든 서인이든, 모두 같은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2,5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과연 어디에 서 있는가.
한국 사회는 최근 수년간 반복적으로 법의 공정성에 대한 질문을 받아왔다.
정치인, 고위공직자, 재벌, 언론 권력자들이 법정에 서는 일은 드물지 않지만, 진정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적다.
그들은 법 앞에 ‘선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법의 그늘 아래 있는 경우가 많다.
법가는 군주에게조차 말한다.
임금이 법을 놓아버리고 사사롭게 쓰면, 상하의 분별이 어려워지고 나라의 질서가 문란해진다.
오늘날 군주에 해당하는 권력자들은 법을 진정 공공의 것으로 존중하고 있는가.
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거나, 자신을 위한 도구로 삼는다면 그것은 이미 법치(法治)가 아니라 사치(私治)다.
항상 강한 나라도 없고, 항상 약한 나라도 없다.
법을 받드는 것이 강하면 나라가 강해지고, 법을 받드는 것이 약하면 나라가 약해진다.
법가는 그렇게 말했다. 지금 우리는 누구를 위한 법을 만들고, 누구에게 그 법을 적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누구는 그 법에서 비켜나 있는가.
오늘날 우리가 사는 현실은, 법가의 원칙이 관철되는 사회라고 말하기 어렵다.
현대 사회 역시 여전히 법외자(法外者)의 그림자 아래 있다.
우리는 법이 살아 있는 나라에 살고 있는가,
아니면 법이 죽은 척하는 나라에 살고 있는가.
지금, 이 질문은 우리 모두의 것이다.(박준섭)